[사설] 남원 앞에만 서면 ‘예산 영웅’이 되는 사람들…기재부 카르텔의 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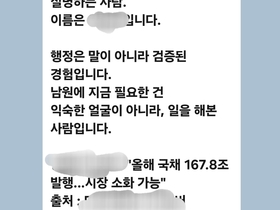
요즘 단체대화방을 장식하는 단골 소재가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의 과거 발언과 경력을 꺼내 “국가 재정도 다뤘던 사람이니 지역 예산도 잘 챙길 것”이라는 식의 기대를 부추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이 경계해야 할 것은 그 홍보가 은근히 깔고 있는 구조, 바로 기재부 카르텔식 프레임이다.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서로를 띄우고, 서로를 보증하며, 출신이 곧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폐쇄적 논리다. 정책과 성과가 아닌, 학연·경력·라인이 정당성을 대체하는 순간, 공공의 영역은 무너진다. 더 큰 문제는 그 프레임이 시민에게 아주 위험한 착각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기재부 출신이 일을 하면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은 달콤하지만, 민주주의에겐 독이다. 예산은 ‘가져오는 돈’이 아니라, 국가의 기준과 절차 속에서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공공 재원’이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을 앞세워 예산을 마치 개인의 능력, 더 노골적으로는 개인의 ‘라인’으로 가져오는 전리품처럼 말하는 순간, 그 지역은 발전이 아니라 예산 중독에 빠진다. 더구나 그런 포장은 늘 이쯤에서 결론으로 흐른다. “우리가 남원 예산을 살릴 사람이다.” 그러나 시민은 이제 묻는다. 그렇다면 공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