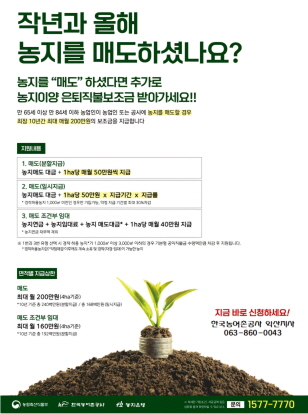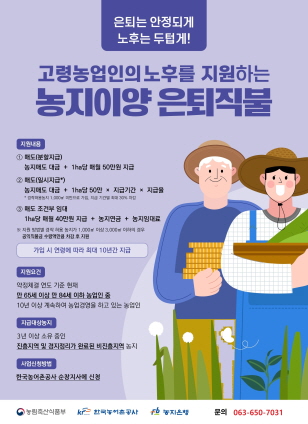“냄새에도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
한 농장주의 항변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상징한다.
악취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는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주민과 업자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은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
결국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이익은 업자에게 흘러간다.
만약 냄새에 색깔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누가, 어디서, 얼마나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키는지 명확히 드러났을 것이다.
주민의 고통을 ‘감정적 민원’으로 치부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업자의 억울함 역시 검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오니 처리의 이익은 은밀히 축적되고, 환경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짊어진다.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는 뒤늦은 땜질식 대응에 머문다.
냄새에 색깔은 없다.
하지만 이익의 흐름과 피해의 무게에는 분명한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은 주민의 삶을 짓누르는 짙은 회색이며, 업자의 장부를 채우는 선명한 녹색 돈빛이다.
이제는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감당하는가.
그 답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냄새의 색깔’을 찾아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