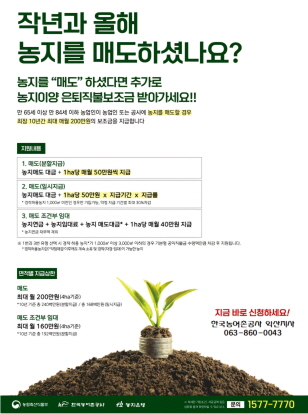(장수=타파인 특별취재팀) = 장수군 산서면 신덕길 164-15번지 일대.
한때 친환경 농업의 상징처럼 불리던 ‘지렁이 농장’이 이제는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되며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가정집은 물론 인근 상가까지 악취에 휩싸이며, 삶의 질은 추락했다.
그러나 정작 시설 운영자는 이익을 쫓아 수도권에서 들여온 오니(하수처리 잔여물)를 말려내며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다.
지렁이 사육을 위한 시설이라던 당초 설명은 이미 빛바랜 거짓말이 된 지 오래다.
■ 지렁이 대신 오니, 드러난 운영자의 민낯
문제의 시설은 ‘지렁이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지렁이를 키우기는커녕 수도권에서 오니를 대량 반입해왔다.
이후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농장은 지렁이와는 무관한 ‘오니 건조장’으로 변질되었고,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주민 김모씨(58)는 “처음에는 지렁이 농장이라 하니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외부 쓰레기 오니가 들어오면서부터 악취가 심해졌다. 군청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군수와 공무원 인허가 과정, 의혹 제기
더 큰 문제는 군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다.
주민들은 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애초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아예 손을 놓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행정이 묵인했다면 주민 피해는 행정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 이모씨(60)는 “군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확인해 보겠다’였다.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변한 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개선될 때까지 이어지는 ‘심층취재 시리즈’
지렁이 농장이 오니 처리장으로 둔갑한 사건은 단순한 악취 민원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이자, 공무원의 인허가 책임 논란까지 얽힌 복합적 사건이다.
본지는 이번 사안을 심층취재 시리즈로 연재하며, 주민 피해가 개선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심층인터뷰] 고향살이 단 꿈 뭉개진 이모 씨…“시골은 고향이 아니라 감옥이 됐다”
장수군 산서면 신덕길. 한때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삶을 꾸리려던 이모씨(60)는 지금 “고향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떨군다.
지렁이 농장으로 알려졌던 시설이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되면서 마을은 악취로 가득 찼고, 그의 귀향의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 “창문도 열 수 없는 집, 이게 무슨 고향이냐”
Q. 귀향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도시에서 살다 보니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깨끗한 공기, 조용한 삶을 누리고 싶어 내려왔죠. 농사도 짓고 이웃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Q. 그런데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악취 때문에 창문 하나 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냄새 난다’며 집에 오래 있질 못합니다. 예전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집이 감옥 같아요.”
■ “군청은 확인만 한다…답변은 늘 같았다”
Q.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으셨다던데요.
“수차례 군청에 전화하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확인해 보겠다.’ 확인만 하고 조치는 없으니 주민들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 “내가 돌아온 고향, 이제는 떠나고 싶다”
Q.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워서 돌아온 고향인데, 이제는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고향살이를 꿈꾸며 온 제 인생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외부에서 쓰레기(오니)를 들여오는 걸 막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건강을 잃고, 삶이 파괴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이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 기자의 눈
이모씨의 고향살이 실패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관리·감독을 외면한 행정, 이익만 챙긴 업자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농촌을 살리겠다며 귀향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도,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